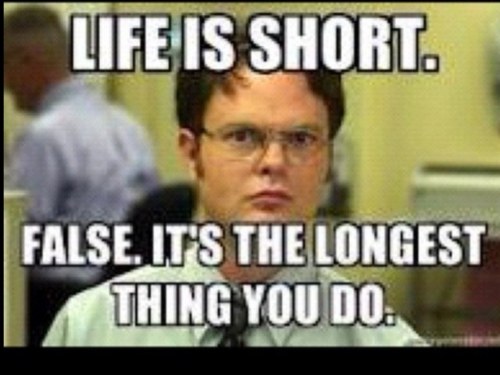어려서 공부를 늦게 시작한 덕에 공부에 대한 집중력 보다는 그 주변의 것들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. 고1이 되고 처음 독서실에 가면서 제일 신경썼던 것이 필체였던 것 같다. 읽고 외는 게 싫으니 쓰는 거라도 흡족하게 했으면 해서였다. 글씨 쓰는 것에 노력을 하다 보니 문구류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.
이렇다 보니 요즘도 가끔 글씨가 잘 안 써지면 맘이 불편하다. 그런 탓에 어떤 펜을 쓸 때, 어떤 책상에서 쓸 때, 어떤 자세에서 쓸 때 글씨가 잘 써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하게 됐다. 대체로 딱딱한 바닥에 종이 한 장만 대고 쓰면 잘 써지지 않고 볼펜 보다는 잉크펜이 잘 써지지 않는다. 하지만 그 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글씨를 쓰는 팔꿈치가 공중에 떠 있을 때다. 습관이라 그런가 나는 팔꿈치가 책상에 닿아 안정감을 가져야 글씨가 잘 써진다.
취직을 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게 팔꿈치를 대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. 팔꿈치가 소속이고 내가 글씨를 쓰는 손이라면 소속이 주는 안정감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다. 소속과 나를 과하게 동일시하면서 본질을 놓치거나 배타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속이라는 건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. 취업을 준비하며 소속에 대한 갈망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소속에 대한 만족을 과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다를지언정 순기능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.
25살 이후론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. 매일 아침이면 샤워를 하며 내가 상처를 주거나 실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'오늘은 이러지 말아야지'하고 다짐했다. 그런데 그런 다짐은 삶 속에서 무산 되었던 적이 많다. 여기서 왜인가를 따라 올라가면 결핍과 상처가 있었던 탓이지 싶다. 내가 누굴 배려하거나 남의 조그만 잘못을 참을만큼의 여유가 없을 때, 샤워하며 한 다짐은 안 하니만 못한 것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.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 지난 4년이었다.
그러다보니 지금의 안정감과 소속감이 기쁘다. 동시에 자책으로 이어지는 잘못의 연속이었던 시간의 나의 깜냥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쉽기도 하다. 주어진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내어 따뜻하고 진중한 사람이 되고 싶던 목표를 언제즘 이룰 수 있을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아직 남은 것이다. 다시 말하면, 팔꿈치를 붙이지 않아도 글씨를 잘 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. 하지만 오랜만에 팔꿈치를 책상에 대면서 글씨를 쓸 때 느껴지는 안정감을 어딘가에 소속됨으로써 느끼는 것 같아 좋다.
항상 더 나은 사람이고자 살아야겠다. 죽고나면 다 똑같은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살았던 동안에 더 나아지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.